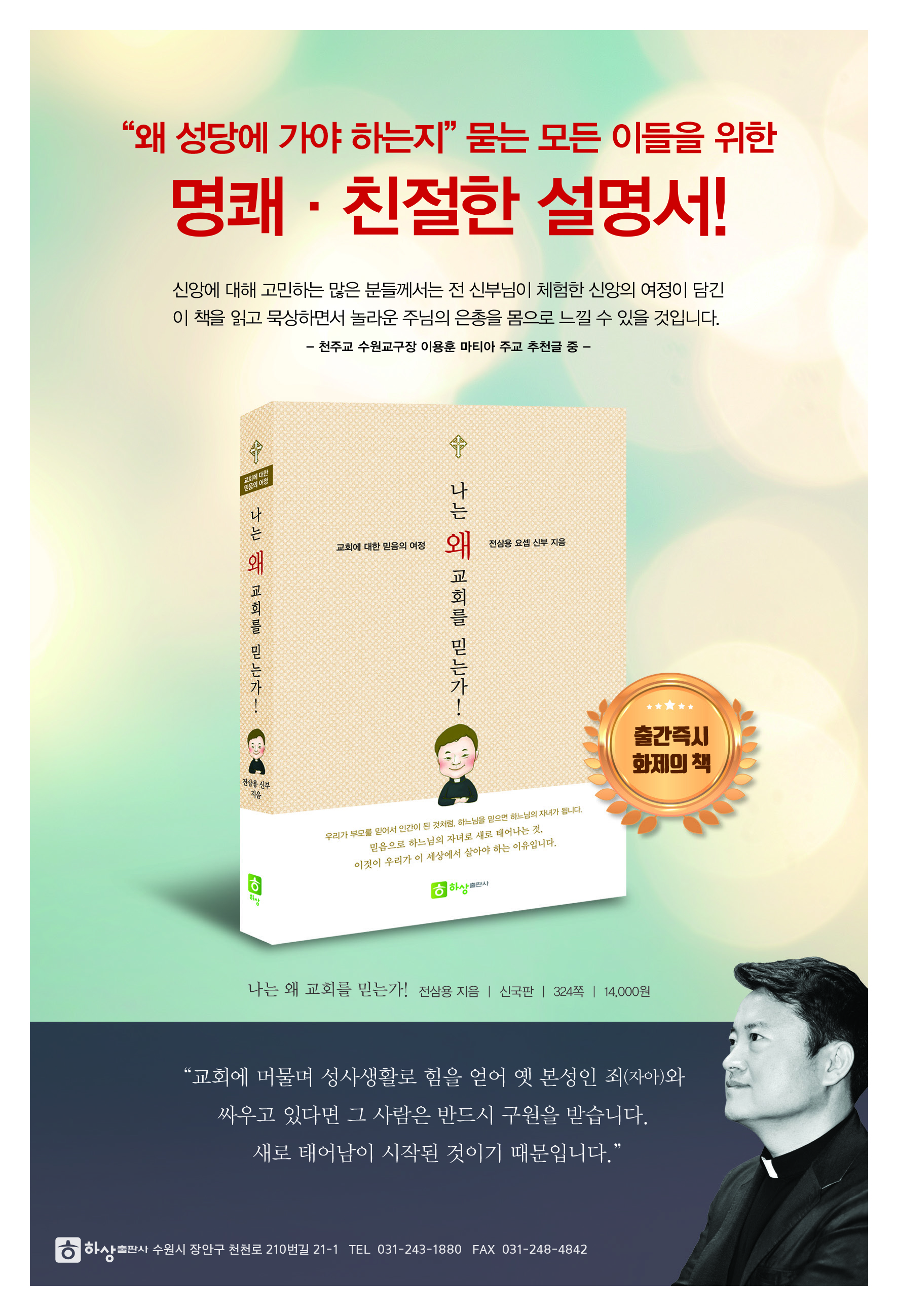이우근
법무법인 충정 대표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젊은 수도사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교황의 면죄부 발행을 비판하는 95개조의 항의문을 내걸었다. 종교개혁을 향한 기나긴 고난의 첫걸음이었다.
루터의 항의문은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로 지속돼야 한다”는 제1조 를 시작으로 “그릇된 평화의 위안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간다”는 제95조로 끝을 맺는다.
처음이 참회, 마지막이 고난이다.
성서의 역사는 끊임없는 개혁의 발자취다.
천지창조 자체가 카오스를 깨뜨리는 코스모스의 혁명이었고, 모세의 이집트 탈출은 모든 해방운동의 선구가 되었으며, 뭇 예언자들의 열정은 ‘우상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영적 개혁의 목표로 모아졌다.
예수는 율법으로 대표되는 제도 종교의 사슬을 끊고 ‘오직 진리만이 인간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는 확신으로 영성(靈性)의 개혁을 외치다가 십자가에 달렸다.
사도 바울의 생애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그 거대한 두 산맥을 정복하는 개혁의 여정에 다름 아니었으며, 요한 묵시(默示)의 절정인 ‘새 하늘과 새 땅’은 ‘옛 하늘과 옛 땅’을 최종적으로 개혁하는 성서의 이상향(理想鄕)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는 부패한 세리, 타락한 매춘부, 천대받던 이방인 등 온갖 비천한 사람들을 아무 차별 없이 친구로 품어 안았지만, 최고 종교 권력자인 대제사장과 권위 있는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에게는 무서운 분노를 뿜어냈다.
유대교의 신정(神政)체제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제도 종교의 기득권자들은 이를 갈며 예수를 죽일 궁리에 골몰했다.
예수의 거룩한 분노는 영혼의 자유를 옥죄는 위선적 종교권력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었고, 이 질책은 교황청에 대한 루터의 항의(protest)로 계승되었다.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protestant)라고 부르는 이유다.
한국 개신교의 모토는 무엇인가? 회개와 고난인가, 축복과 형통인가?
뉘우침의 회(悔)만 있고 고침의 개(改)가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영혼의 숨결이 종교적 의식(儀式)으로 대체되고 웅장한 성당이 호화로운 예배당으로 바뀐 데 불과하다면, 개신교 역시 또 하나의 형해화(形骸化)한 제도 종교에 다름 아닐 것이다.
만약 루터가 이 시대, 이 땅에 살아있다면 95개조가 아니라 아마도 950개조는 써야 하지 않을까?
가톨릭이 아니라 개신교를 상대로 말이다.
수천억원대의 화려한 교회당 안에서 집 없고 가난한 이들이 무슨 위로를 받을 것인가?
으리으리한 대리석 강단에서 어떻게 머리 둘 곳조차 없었던 예수를 전할 것인가?
교단 총회에 가스총이 등장하는 마당에 무슨 입으로 이 폭력의 사회를 꾸짖을 것인가?
성추문에 휩싸인 목회자들이 무슨 낯으로 소돔 같은 오늘의 타락상을 질책할 것인가?
숱한 교파들로 분열된 개신교가 이념·세대·지역·계층으로 갈가리 찢긴 분단의 조국에 어떤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초대교회의 지도자는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와 아무 혈연이 없는 베드로였다.
성서의 사도직은 세습되지 않는다.
부유한 대형교회의 강단을 혈육에게 물려주면서 사회의 양극화를 걱정하고 빈부(貧富)의 대물림을 비판하는 것은 이만저만한 위선이 아니다.
종교의 사회적 책임은 막중하다.
한국의 종교 인구는 53%에 이르고, 개신교 신자는 전 국민의 20%에 육박한다.
지난날 한국 교회는 국가발전에 적잖은 기여를 해왔지만, 지금은 도리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자신이나 친족의 비리로 국민을 분노케 한 이들이 많았는데, 대형교회의 장로였던 대통령들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은 신앙의 슬픔이자 교회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정통의 신조를 벗어난 교리의 이단(異端)보다 신앙윤리를 저버린 ‘삶의 이단’이 더 무섭고 더 악마적이다.
교리나 제도의 개혁보다 인격과 삶의 쇄신이 더욱 절실하다는 뜻이다.
지난날 한국 교회는 국가발전에 적잖은 기여를 해왔지만, 지금은 도리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종교개혁은 완료된 것이 아니다.